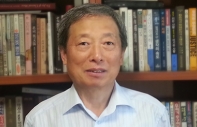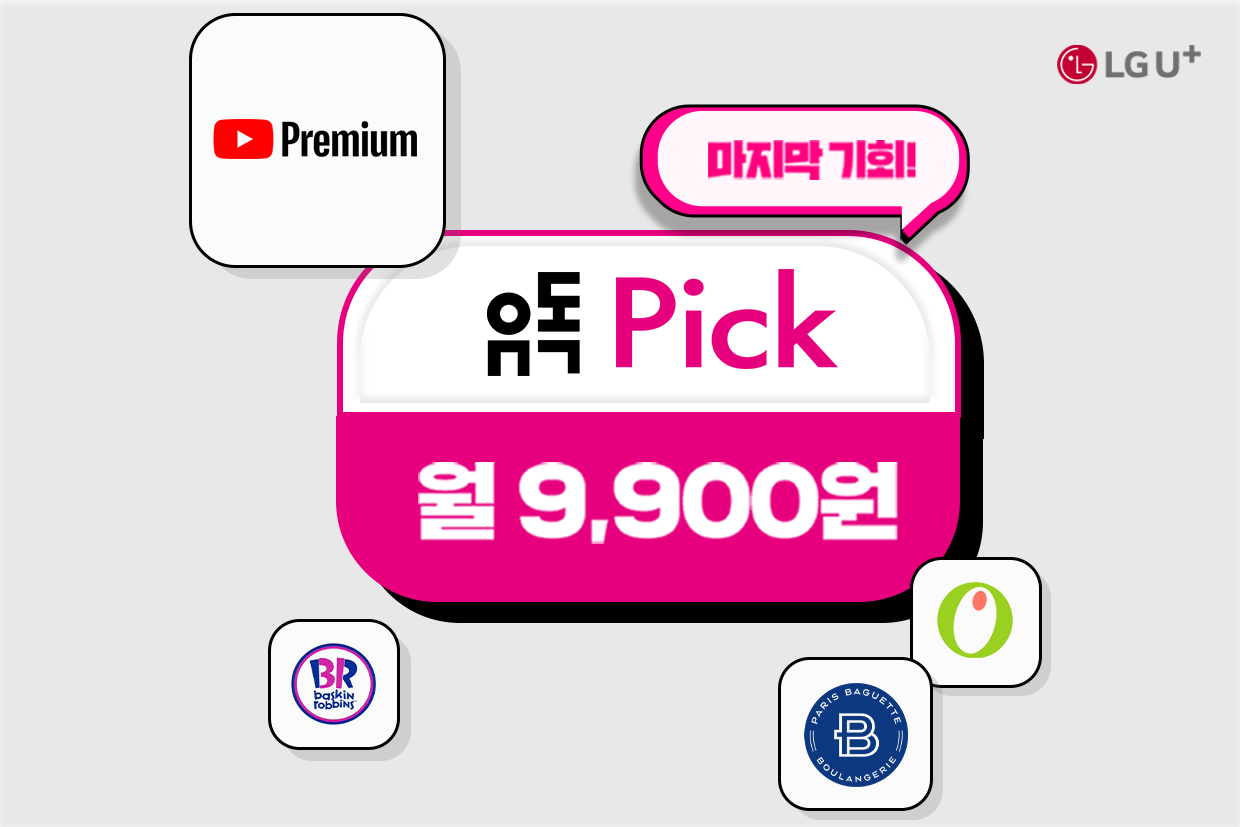환율이 기초경제 여건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누군가는 특별 이익을 얻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특별 손실을 입기 마련이다. 다른 사정이 변하지 않는데도, 환율을 억지로 올리면,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지 모르지만, 물가는 불안해진다.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물가안정으로 가계의 후생과 복지는 개선되지만 수출경쟁력은 약화된다.
미시간 주립대 방문객으로 있었던 1993년 원화의 대미환율이 800원대에서 이듬해에 700원대로 내렸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겨 북 아메리카 땅 끝 “키웨스트”로 그리고 머나먼 서부로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었다. 97년 나와 똑 같은 과정을 거친 다른 친구는 환율이 연초 840원대에서 연말에는 1960원대로 오르는 바람에, 남의 나라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쩔쩔맸다고 하였다.
나의 경우에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까지 높아졌다. 반대로 그는 원화가치가 끝없이 추락하여 이래저래 체면을 구긴 셈이다. 윤택한 삶도, 그리고 쪼들리는 가계도 때때로는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사회 환경과 국가 위상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구태여 갖다 붙인다면 나는 소위 "환율주권" 강국의 여유를, 그는 “환율주권”약체국의 설음을 피부로 체험한 셈이다. 환율주권이라는 용어를 억지로 사용하려면 자국 통화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여 경제 활력과 동시에 자국민의 후생을 생각하여야 한다. 수출을 장려한다고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환율 주권이 아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회비가 엇갈리는 모습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국민계정을 들여다보면, 환율의 마술 아닌 마술을 연상하게 한다. 그 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마이너스 성장과는 달리 1인당 명목국민소득(GNI)은 전년대비 2127만5천원에서 2192만3천원으로 3.04% 상승하였다. 그러나 원화 환율이 13.6%나 크게 올라, 달라 베이스 국민소득은 1만9296달러에서 △10.99%나 크게 하락한 1만7175달러로 떨어졌다. 달러 표시로만 보면 당시 우리나라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당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8%p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나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4.0%p를 기록하였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3.4%(소비자 물가 2.8%)에 달하였다.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소비수요 감소, 국내투자 감소 같은 내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증대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저성장의 어려움 속에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더군다나 가계 부실이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국제경제, 국제정치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생산성 같은 국가경쟁력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관찰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기초경제여건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억지 환율 조율(tuning)은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치를 생각하여야 한다. 환율주권이라는 얼토당토아니한 명분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다가는 특정분야를 무리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순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확실성을 잉태하게 된다. 게다가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후생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환율이 국가경쟁력의 결승점이 되기도 하지만, 수출지상주의 환경에서는 환율이 경쟁력의 출발선이 되기도 한다. 결승점과 출발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적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