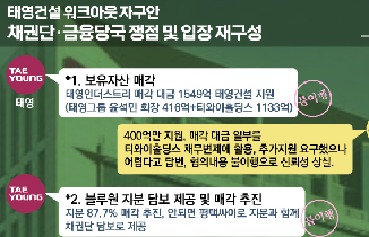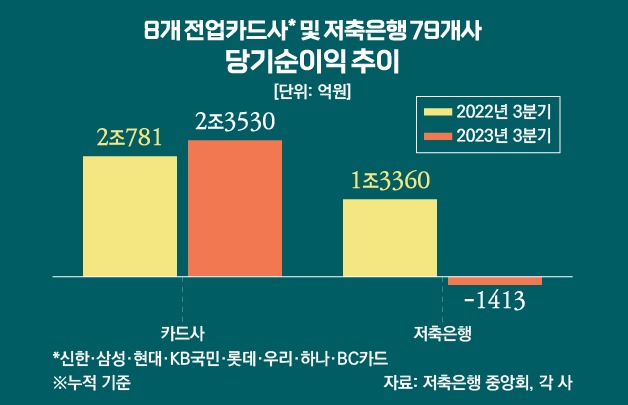금융연구원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제안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다’는 점을 유인책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과거 사례에서 보면 의문이다. 정부의 공적 통제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도 공공연히 있다고 봐야 한다. 낙하산 논란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을 보면, 이를 믿을 바보도 없다.
오히려 ‘공적 통제의 배제’는 오너십이 있거나 주인의식이 확고한 곳에서 적었다. 현재 4강 체제를 구축한 신한과 하나, ‘농민 조합’으로 백그라운드가 조금은 다른 농협이 대표적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롯데와 삼양사의 지배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이 그렇다. 정치적 배경이 남다른 대구은행과 신한금융에 편입되기 전의 제주은행도 비슷한 성격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의 입김을 덜 타면서 스스로 행장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후 많은 은행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들 은행의 생존력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사실상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교보의 지배력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길 후폭풍을 두려워할 뿐이다.
이런 사례는 꽤 있었다. 과거 제일은행을 펀드에 넘긴 가격이 헐값이라는 논란이나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긴 후 정부와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곤욕을 치렀다. 반대로 M&A에 적극적으로 나서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인수한 국내 금융그룹들에선 정부나 관료를 향한 이런 논란이나 후폭풍이 없었다.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지언정….
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써먹는 사람들과 교보생명그룹을 같게 보는 것도 논란거리다. 교보생명은 1958년 8월 대한교육보험으로 출범해 금융부문 계열사를 늘려왔다. 1980년 교보문고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는 금융자본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산업자본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56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금융전업그룹이다.
 | |
|
교보의 이런 특성은 금융 대형화 논의가 활발해질 때마다 그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였다. 과거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으며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교보생명에 한 배를 탈 것을 제안했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위성복 행장(전남 장흥)은 같은 동향 기업인이었던 故 신용호 회장(전남 영암)에게 SOS를 쳤다.
조흥은행과 교보생명이 함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자는 복안이었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조흥은행은 이후 추가 공적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결국 신한금융그룹에 넘어가며 간판을 내렸다. 만약 이 딜이 성사됐다면 조흥 간판을 내리든, 교보 간판을 내리든 완전히 다른 금융 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지난 2011년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제안으로 KB금융과 주식스왑 협상이 있었다. 다소 불안정한 교보생명의 경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주식을 상호 보유하자는 것이다. 보험부문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KB금융도 교보생명을 지렛대 삼아 금융지주회사의 모양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의적이었으나, 이사회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동일인 지분한도(10%) 규정에 묶여 무산됐다.
이것이 지금도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지분 인수에 나설 경우 정부가 어렵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다. 교보는 당연히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지분을 얻고 싶어한다. 혼자 살 수 있는 지분은 대략 15% 정도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자 또는 공동 경영자를 물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하면 교보는 10%밖에 살 수 없다.
그 이상의 지분을 사려면 금융당국의 특별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전업가인 교보생명과 오너에게 특별승인을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특별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후 책임의 소재가 생기는 것이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불거지면 이를 승인한 정부가 부담을 안는 구조다. 그게 싫은 것이다.
요즘 세월호 사고로 관료들의 각종 행태에 비판이 많다.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관료들의 속성에 기인한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모습이다.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교보생명 배제론의 기저에도 이런 관료들의 뿌리 깊은 업무 행태가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글 싣는 순서]
①불완전변태 한빛은행의 탄생
②장사꾼 故 김정태의 ‘국민+주택’ 합병
③김승유의 서울•외환은행 주워 먹기
④라응찬의 세력 바둑 조흥과 LG카드
⑤한국의 CA 꿈꾸는 농협의 민간 체험
⑥M&A로 만들어진 한국 신 Big4 금융
⑦재미없어진 마지막 승부 우리은행 매각
⑧금산분리 규제에 덧씌워진 오너리스크
⑨虛虛實實 희망수량 매각 방식의 승자는?
⑩경영권 매각을 배제한 어떤 것도 꼼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