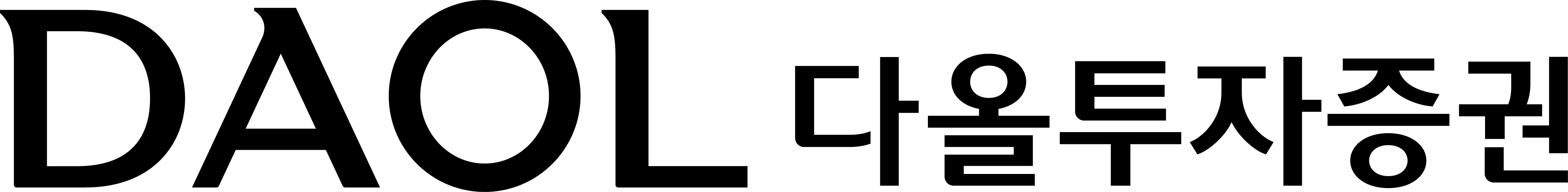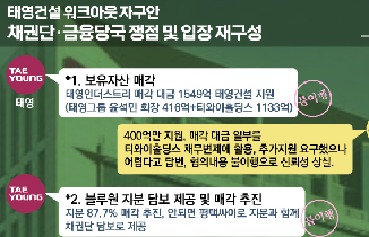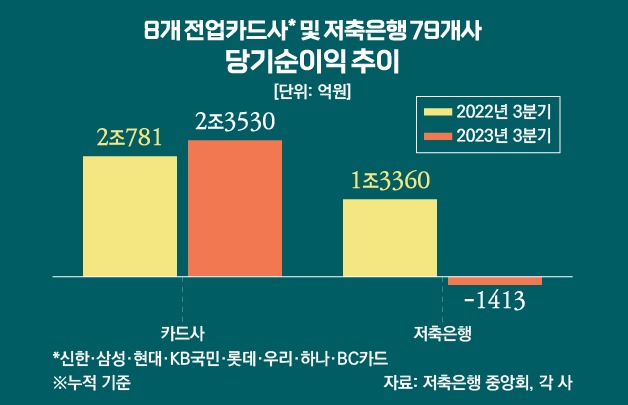1. 금융감독 시스템의 훼손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임영록 회장이나 이건호 행장 모두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다. 낙하산은 보통 ‘제대로 착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동아줄의 튼튼함을 대변한다. 이번 최 원장의 결단은 이런 측면에서 고심이 많았을 터다. 그리고 최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자로서 영(令)을 세웠다.
대신 잃은 것도 있다.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생긴 문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결정은 권고일 뿐 구속력은 없다. 최 원장이 이번에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이유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금융감독시스템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근거 논리는 관치 문제였다.
당시 재정경제원은 거시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정부 안에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외화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다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는 반성의 결과물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출범 배경이다.
재경원에서 금융감독정책 부문을 떼어낸 것에 머물지 않고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떼어낸 영역이 ‘00부’라는 정부 부처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이 그 일환이다. 정부의 한 부처가 아니라 독립된 성격의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이를 감독하는 국회의 소속 위원회도 재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 자리를 잡았다.
물론 지금 금융위원회는 이때의 조직 위상과 많이 다르다.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무국 형태에서 지금은 다시 정부의 한 부처로 올라갔다. 그러나 출범 당시 흔적은 현재의 금융위원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금야금 훼손되긴 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모습이 그렇다.
금감원에 남아 있는 흔적이 제재심이다. 제재심은 감독 당국자들만이 모여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민간 위원들도 참여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래서 제재심은 그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지만,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
최 원장이 이번 KB 관련 제재심이 6차례나 열리면서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자,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장’과 ‘절차의 민주화’를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강조가 무색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이든 다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의 큰 철학을 또 하나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
한번 구멍이 뚫린 둑은 다음엔 더 쉽게 무너진다. 금융감독원은 옛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개했지만, 이젠 마찬가지 처지가 됐다.
2. 낙하산으로 사는 법

이번 사태를 일으킨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수장은 소위 낙하산으로 불린다. 임영록 회장은 취임 당시 “공직을 물러나고 KB금융지주 사장으로 3년 가까이 근무했다”면서 낙하산 분류를 불쾌해했으나, 그렇게 봐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관피아는 아니지만, 이건호 행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 행장은 오래전에 연구원 생활을 접고 금융회사에 취업(옛 조흥은행 리스크관리부문 임원)을 했었다. 국민은행에서도 상당기간 근무했으나, 조직 내부 출신이 아닌 데다 현 정부와의 이런저런 인연으로 낙하산 구설에 오르내렸다. 임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 행장도 많은 해명을 했으나, 쉽지 않은 탈색이었다.
낙하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사람 사는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진 않아 이들 낙하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땐 아쉽고 미안한 점도 있다.) 특히 문제가 터지면 더 그렇다. 설사 꼭 그가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은 사실 낙하산 천국이다. 국책 금융기관도 많고, 당연히 낙하산 몫으로 분류하는 감사 자리도 널려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낙하산이 살아가는 법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낙하산은 보통은 센 사람이다. 관료 출신은 당연히 관료 사회에 선후배가 많다. 정권의 줄을 탄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다 보니 이들 낙하산의 착지점으로 지목된 금융회사와 그 직원들은 항상 고민이다.
낙하산이 떨어져 조직의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 그만큼 자리가 줄어 불만이다. 그러나 이 불만은 낙하산의 동아줄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말 센 동아줄이면 굳이 내가 움직여 가지 않아도 이리로 온 것이니 나쁠 것이 없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금융회사 노조도 대체로 이런 경향을 보인다. 처음엔 ‘낙하산 반대’라는 깃발을 높이 쳐들다가도 조용히 물러난다. 낙하산을 끝내 막아낸 사례는 아직 없다.
그래서 낙하산들은 보통 일을 조용히 처리한다. 있는 듯 없는 듯 모나지 않게, 문제가 터지지 않게 지내는 게 그들 나름대로 경험에서 체득한 법이다. 어차피 공직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줘야 하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이니,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공직 후배들이 아쉬워할 때 자리를 좀 일찍 비켜주면 후배들은 또 알아서 다른 자리를 알아봐 준다. 이런 미덕(?)이 그 회사에 긍정적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차피 그들에게 그런 것은 관심 밖의 일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KB 사태는 두 분 수장이 이 불문율 같은 ‘낙하산이 사는 법’을 간과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전임 경영진과 대를 이어 마찬가지로….